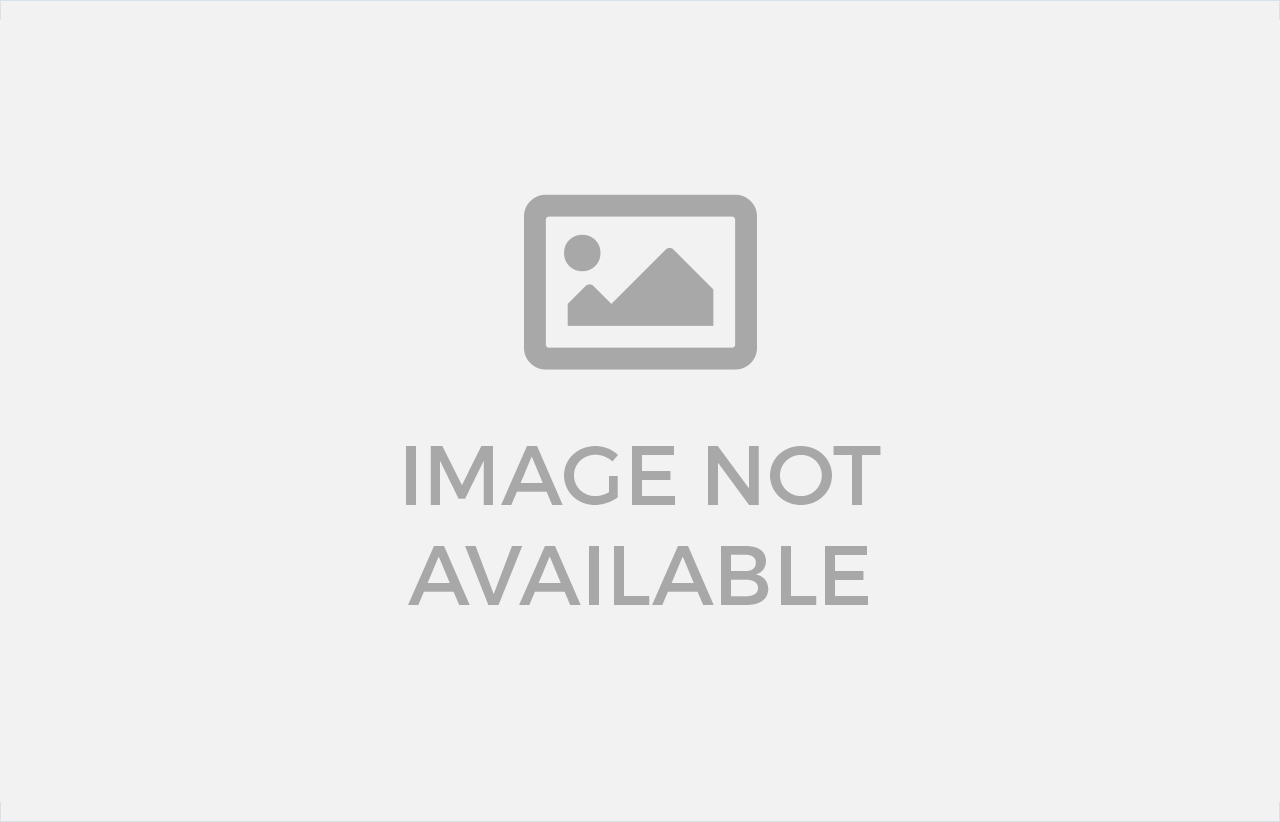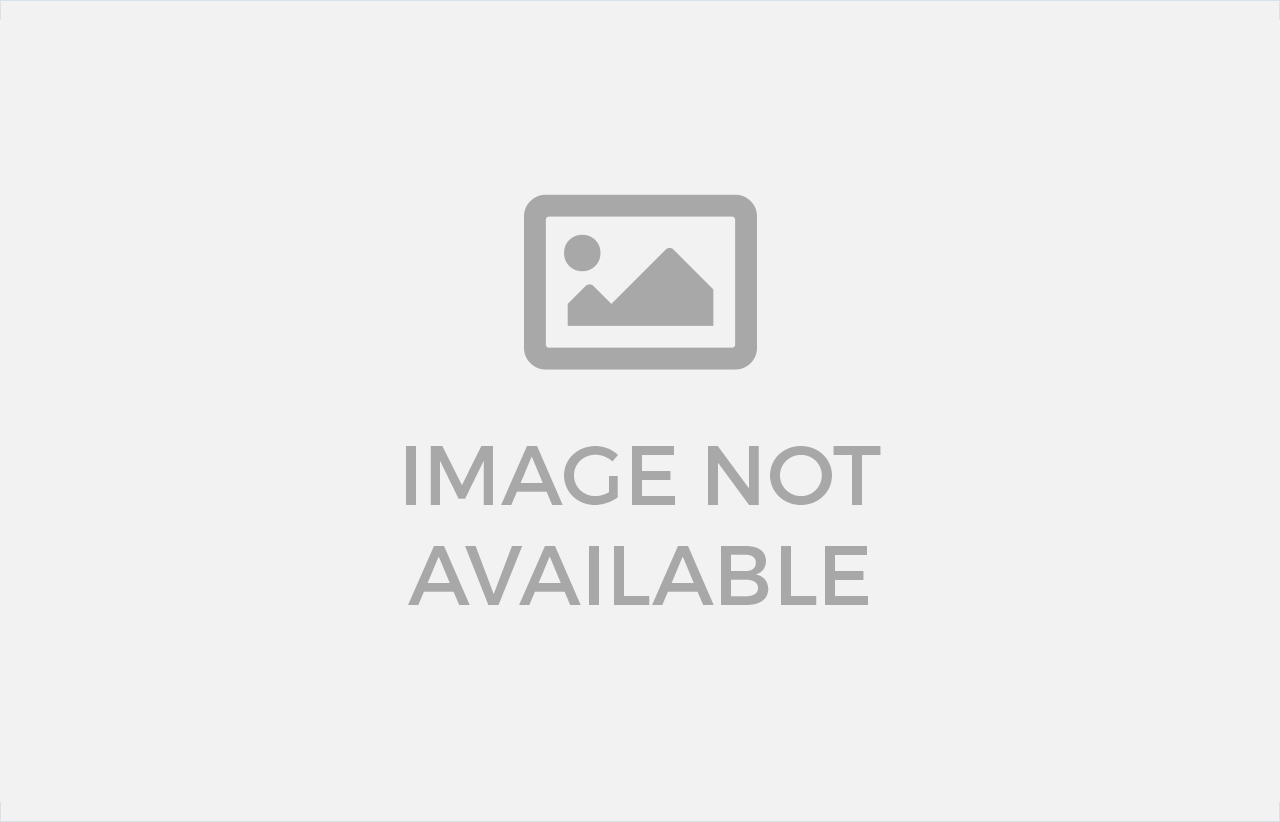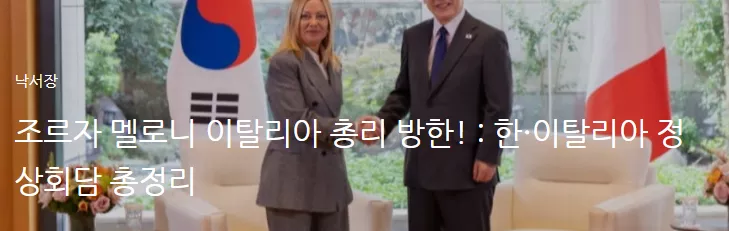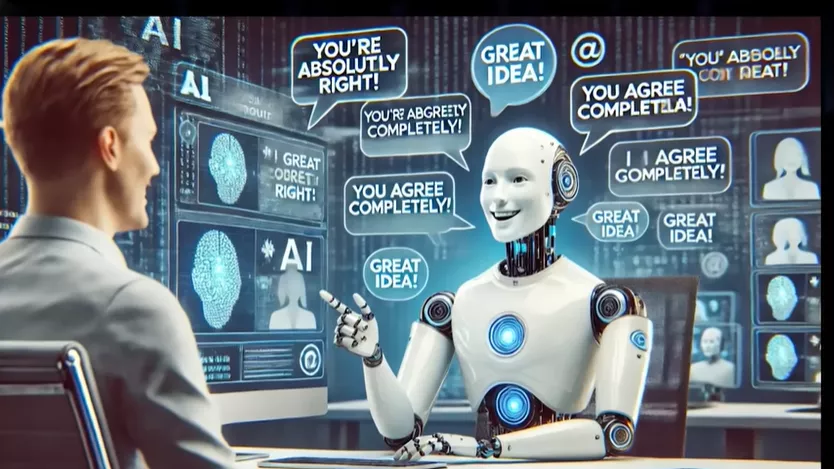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05-12 | 수정일 : 2025-05-12 | 조회수 : 1045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에 이사했다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향후 보증보험 및 세입자 권리 보호 관련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퇴거한 경우, 대항력은 소멸된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1월, B씨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A씨의 임차권은 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였다.
2019년 2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험사에 양도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같은 해 3월 12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3월 20일 이를 명령했으며 등기는 4월 8일 완료됐다. 그러나 A씨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인 4월 5일 보험금을 수령하고 주택에서 이사했다.
이후 해당 주택은 강제경매로 넘어갔고, 2021년 7월 매수인 이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서울보증보험은 A씨로부터 양도받은 보증금 채권 중 경매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를 이씨에게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서울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시점이 퇴거 이전이고, 경매 이전에 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A씨는 대항력을 유지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등기 자체가 완료되기 전 주택을 퇴거한 이상 기존 대항력은 소멸된다"며 "이후 등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항력의 발생으로 간주되며, 선순위 권리로 복원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임차권 등기제도의 법적 효력과 대항력 유지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후 임차인이 퇴거하고 나서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대항력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보증금 반환 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증보험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세입자 보호와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신중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요건 간의 시간적 간극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우 변호사는 “임차권등기제도는 퇴거 후에도 대항력을 보전하려는 세입자 보호 장치지만, 실무적으로는 등기 완료 시점이 결정적”이라며 “퇴거 전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택 등기부에 권리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상태에서 인정된다.
근저당권: 채권자가 일정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담보권으로, 임차권보다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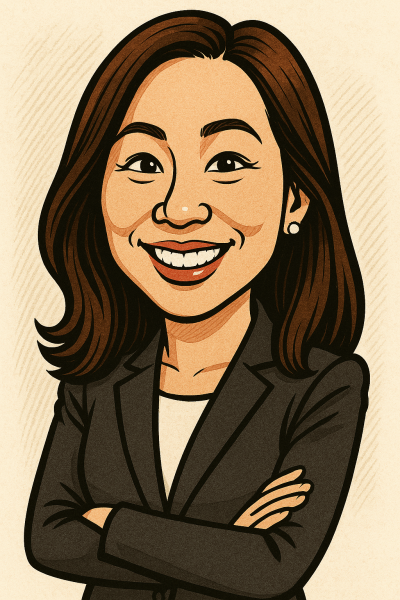
(latte1971@gmail.com)
문화경제일보 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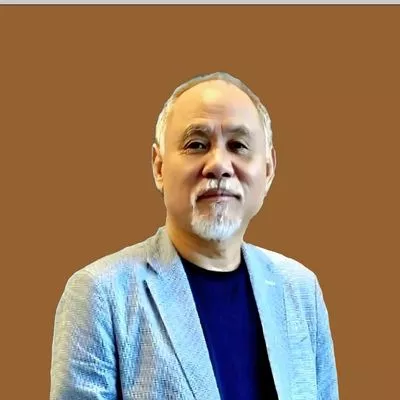
![[인물탐구] 조광규 대표, 경영과 예술을 잇는 다리](/_gallery/kced/202508/image-68a566e1dbd7c.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