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5-08-15 | 수정일 : 2025-08-15 | 조회수 : 31 |
 물리학에서 공명(Resonance)은 특정 주파수와 맞아떨어질 때 에너지가 증폭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백범 김구의 독립운동 역시 이와 닮아 있었다. 무작정 힘을 쓰는 대신, 그는 세계 여론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장 멀리 울릴 수 있는 순간과 사건’을 찾아냈다. 그 울림은 때로 작은 거사에서 시작해 대륙을 건너가고, 세계 강대국의 정치 무대까지 파고들었다.
물리학에서 공명(Resonance)은 특정 주파수와 맞아떨어질 때 에너지가 증폭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백범 김구의 독립운동 역시 이와 닮아 있었다. 무작정 힘을 쓰는 대신, 그는 세계 여론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장 멀리 울릴 수 있는 순간과 사건’을 찾아냈다. 그 울림은 때로 작은 거사에서 시작해 대륙을 건너가고, 세계 강대국의 정치 무대까지 파고들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구공원. 윤봉길 의사의 폭탄이 일본군 장성들을 쓰러뜨린 순간, 그 울림은 한반도 밖으로 뻗어나갔다. 이 사건은 단지 무장투쟁의 성공이 아니라, 김구가 그 주파수를 세계에 맞춘 결정적 공명이었다. 당시 상하이는 국제조계라는 특수한 공간이었고, 수많은 외국 기자와 외교관이 일본군의 기념식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사의 결과는 즉시 국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중국의 장제스는 임시정부를 공식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구는 작은 울림이 거대한 반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다.
공명을 만들려면 악기의 줄을 정확히 조율해야 한다. 김구에게 그 줄은 사람과 전략이었다. 그는 이봉창을 통해 일본 심장부에서의 울림을 시도했고, 윤봉길로 중국과 국제사회에 전달되는 울림을 완성했다. 무장투쟁, 외교, 교육, 선전활동은 각기 다른 악기였지만, 그의 지휘 아래 하나의 하모니를 이뤘다. 세계가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독립의 메시지는 몇 배로 증폭됐다.
광복은 김구의 공명이 만들어낸 반향의 한 결과였다. 그러나 해방 후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새로운 불협화음을 맞이했다. 김구는 이를 ‘완전한 독립의 미완성’으로 보았고,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공명의 완성이라고 믿었다. 1948년, 그는 남북협상에 나서며 또 한 번 울림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그 울림은 냉전의 벽 앞에서 멀리 퍼지지 못했다.
오늘의 우리는 여전히 김구의 울림 속에 있다. 국제무대에서 독립의 메시지를 증폭시키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주파수를 찾아내던 그의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 작은 목소리라도 주파수를 맞추면 세계를 흔들 수 있다. 백범 김구가 남긴 공명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이 땅과 세계 곳곳에서, 누군가의 귀에, 마음에, 그리고 미래에 울리고 있다.

(12kerre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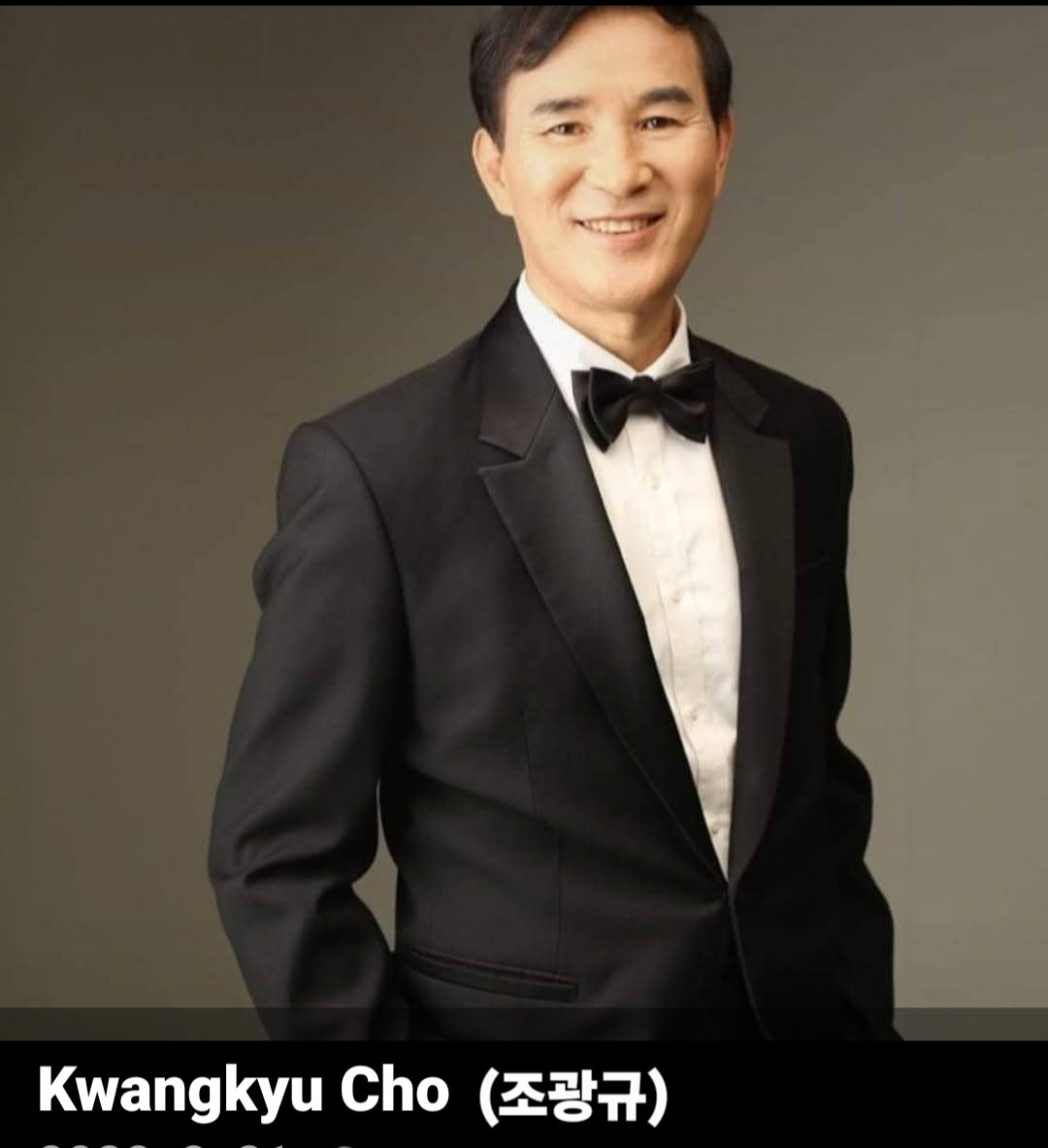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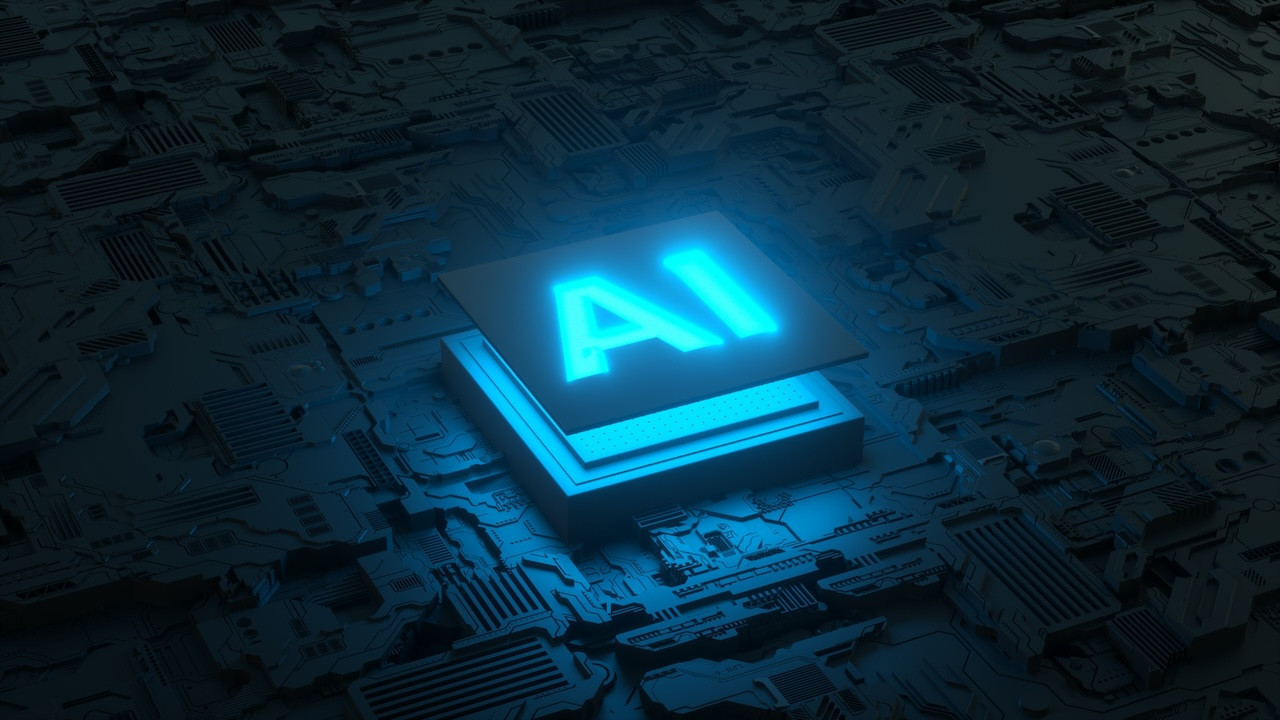

![[뉴욕증시] 9월 시작, 고용보고서에 쏠린 눈…계절적 약세장 진입](https://kced.kr/_imgs/photo/bbs_image_0729.jpg)

![[뉴욕 금가격]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1.2% 상승, 3,500달러선 재돌파](https://kced.kr/_imgs/photo/bbs_image_191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