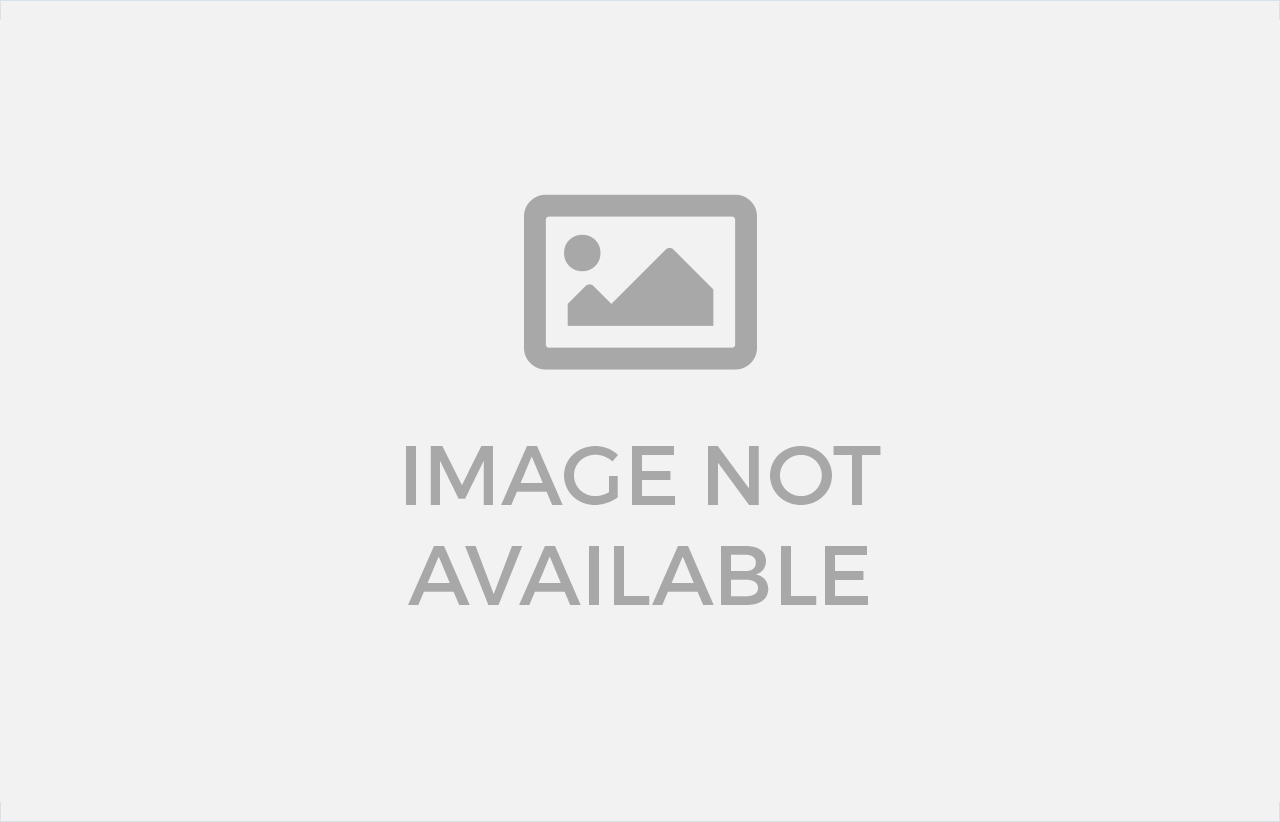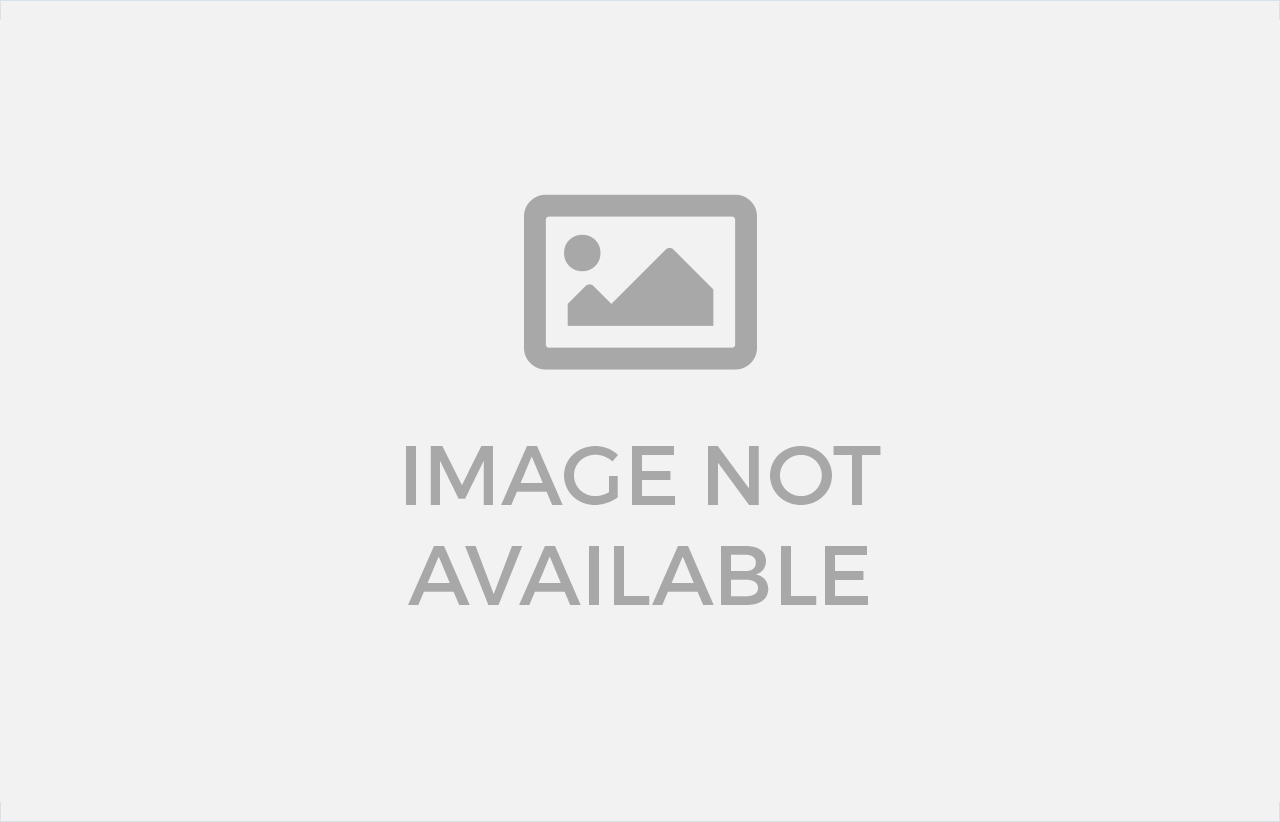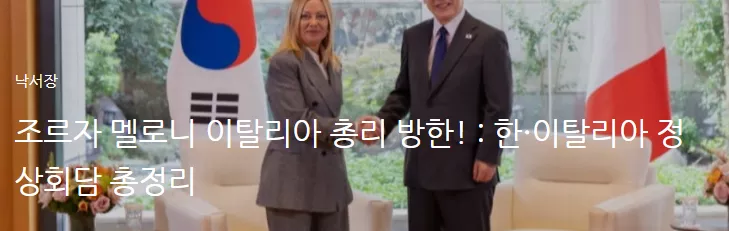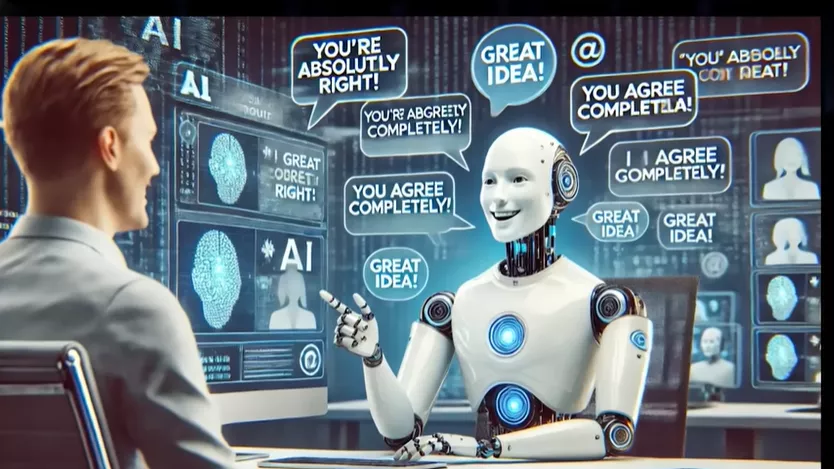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08-22 | 수정일 : 2025-08-22 | 조회수 : 1032 |

도자기의 색은 곧 세계관의 은유다. 청 건륭(1736~1795) 연간에 제작된 이 미황유(米黃釉) 고족배(高足杯, 높이 12.3cm)는, 그 은유를 가장 절제되고도 화려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황옥(黃玉)을 닮은 은은한 빛 위로 파도무늬가 부드럽게 흘러가며, 안쪽에는 하늘빛 유약이 스며 있어, 마치 대지와 하늘, 그리고 바다의 만남을 한 점 기물 속에 담아낸 듯하다.
빛과 색이 만든 이중의 세계
겉으로 드러난 미황유는 이름 그대로 쌀빛을 띠는 황색으로, 따뜻하면서도 품위 있는 기운을 전한다. 단순한 노란색이 아니라, 옥처럼 반투명한 깊이를 가진 색으로, 불과 흙이 만나 이룩한 신비의 산물이다. 표면에는 파도(波浪) 무늬가 부드럽게 부각되어 있어, 정적인 기형 위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그 파동은 바람과 물결,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잔잔히 번져가는 생명의 리듬을 연상시킨다.
내면에 펼쳐진 또 하나의 하늘
안쪽을 들여다보면, 부드럽게 깔린 연청색 유약이 외부의 황색과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넘어, “겉은 대지, 속은 하늘”이라는 은유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마치 컵을 손에 들면, 외부에는 황토의 생명력이, 내부에는 하늘의 청정함이 함께 담겨 있는 듯하다. 바깥은 중후하고 안은 청아한 이중성은, 건륭제 시대 장인들이 추구한 복합적 미학을 잘 보여준다.
황실의 기호와 장인의 기예
건륭제는 예술에 있어 유난히 집요한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송·명대의 고전적 도자기를 집대성하는 동시에, 그 위에 청대만의 화려함과 실험 정신을 더했다. 이 고족배는 그런 기호의 산물이었다. 관요(官窯)의 도공들은 유약의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가마의 불길을 정밀히 다스려 옥 같은 미황색을 빚어냈다. 또한 금·은의 문양 장식을 더해, 황실의 권위와 신성함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오늘날의 울림
12.3cm라는 작은 크기지만, 이 기물 속에는 대지와 하늘, 물결과 바람, 권위와 기원의 의미가 응축되어 있다. 손에 들면 가볍지만, 눈으로 바라보면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작품. 그것이 바로 황실 도자기의 매력이다.
이 고족배는 18세기의 황실을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속삭인다. “조화는 대비 속에서 완성된다.” 황옥빛과 하늘빛, 파도의 리듬이 어우러진 잔은 지금도 여전히 절제된 화려함의 미학을 보여준다.
| 중국 골동품 소장가 조광규의 귀한 작품들을 시대의 맥락과 이야기로 풀어내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10%는 문화경제신문사 재단을 통해 전액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회공헌에 기부됩니다. |

(gurcks1785@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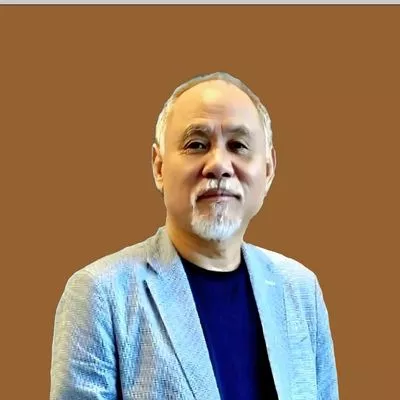
![[인물탐구] 조광규 대표, 경영과 예술을 잇는 다리](/_gallery/kced/202508/image-68a566e1dbd7c.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