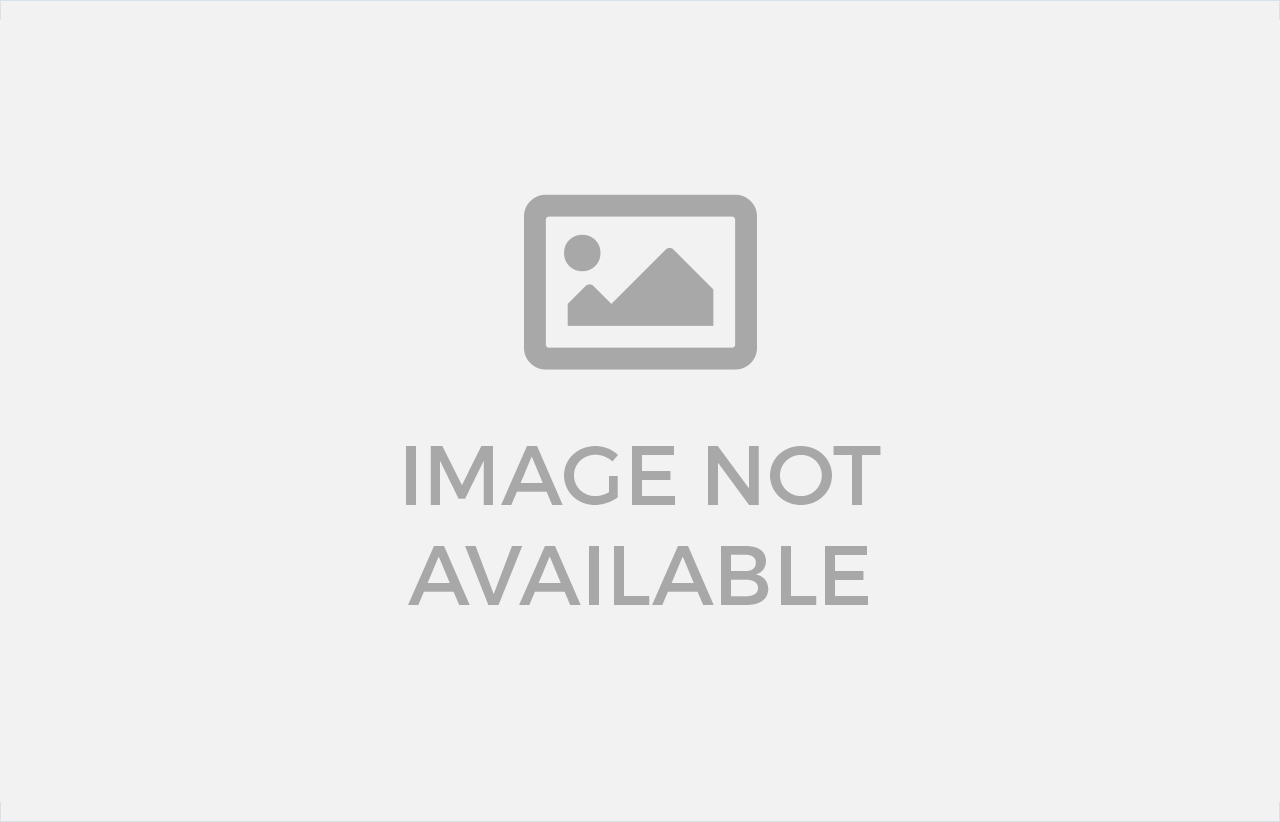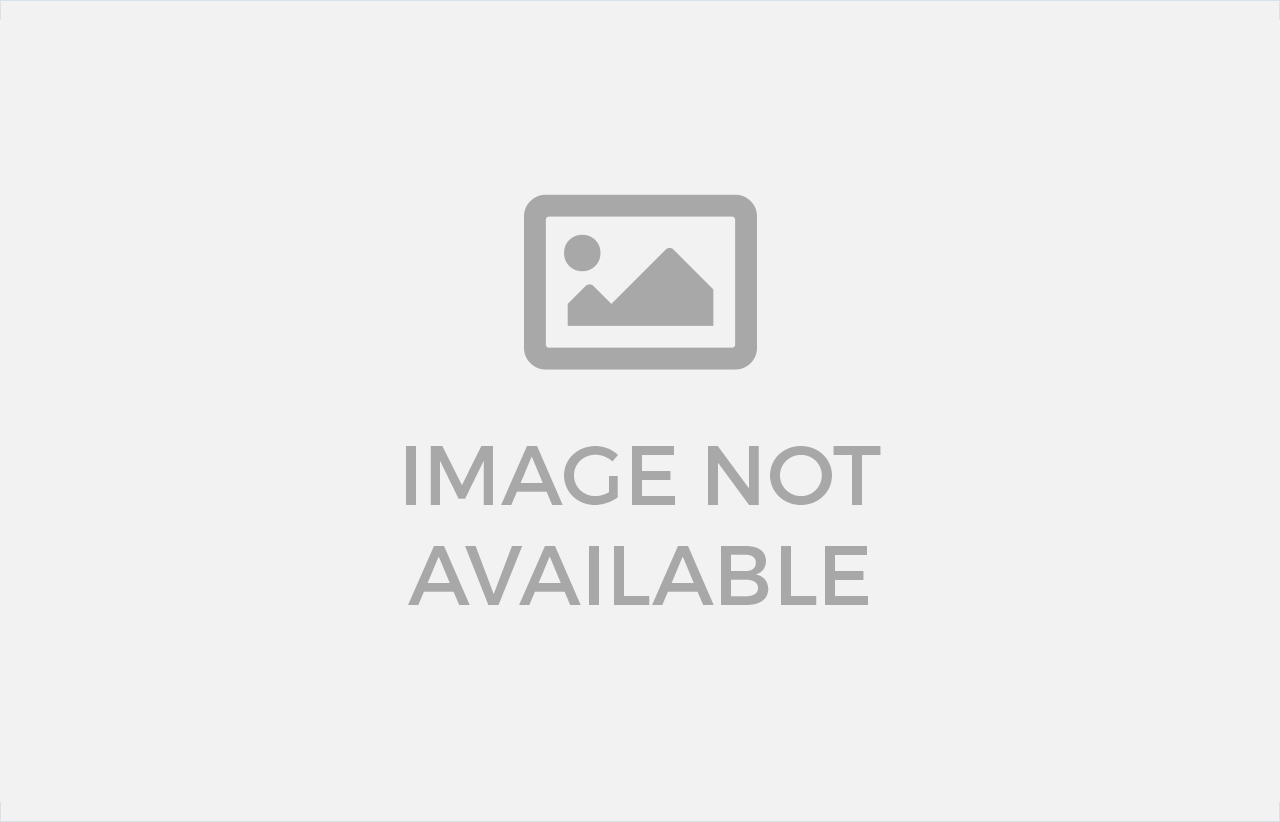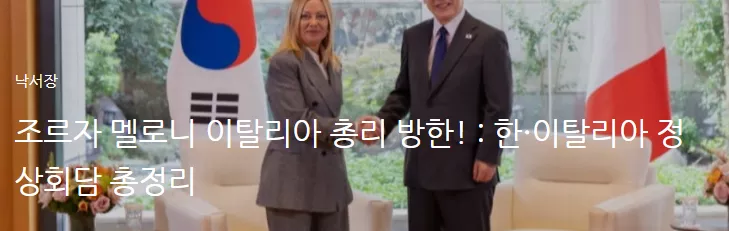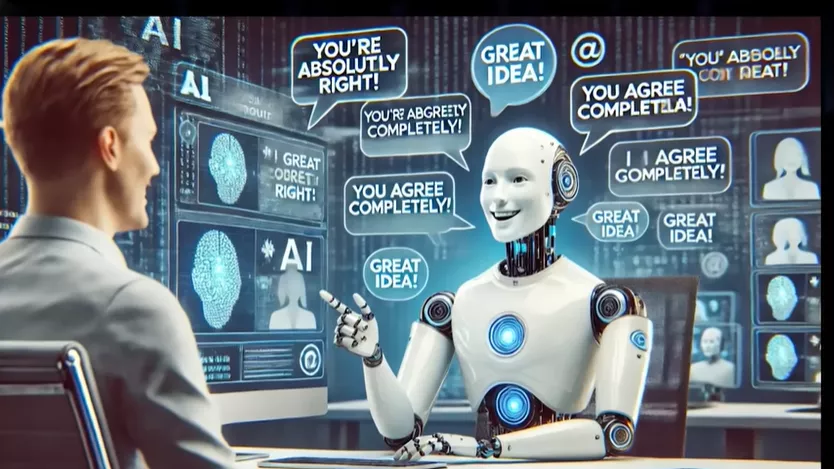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08-20 | 수정일 : 2025-08-20 | 조회수 : 1050 |

중국 도자기 역사를 이야기할 때 송대(宋代, 960~1279)는 ‘예술적 절정기’로 불린다. 이 시기 도자기는 화려함 대신 단아함과 절제미를 추구했고, “비색(翡色)의 청자와 은은한 균열(開片)의 미학”으로 세계 도자사에 길이 남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소개하는 작품, 북송(960~1127) 관요(官窯) 어문문(魚鱗紋) 장경병(長頸瓶)은 그 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 병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촘촘히 얽힌 균열 문양이 펼쳐져 있다. 이를 어문문(魚鱗紋)이라 부른다. 원래 이러한 균열은 소성 과정에서 유약이 수축하는 정도가 태토(胎土, 도자기 흙)와 달라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송대 도공들은 이를 단순한 결함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균열 속에서 우연이 만들어내는 질서와 문양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이를 의도적으로 구현해냈다.
이러한 개편(開片, 크랙글레이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불완전 속에서 완전을 보는 동양 미학”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균열의 결마다 다른 색이 스며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고 깊은 무늬를 드러낸다. 즉, 이 도자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진화하는 예술품인 셈이다.
이 작품은 높이 23.5cm, 가늘고 긴 목과 넓게 벌어진 입을 가진 장경병(長頸瓶)이다. 풍만한 하부와 길게 뻗은 목은 균형과 긴장감을 동시에 주며, 곡선미 속에 단아한 기품을 드러낸다. 이러한 형태는 송대 도자기의 특징인 절제된 선과 조형의 단순미를 잘 보여준다.
장경병은 단순한 실용품이 아니라 궁중 진열용, 제례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병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와 문화를 상징하는 기물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제작된 관요(官窯)라는 점이다. 관요는 황실 직속의 가마로, 오직 황제와 귀족만을 위해 최고 수준의 도자기를 제작했다. 즉, 이 장경병은 일반 민간인이 사용할 수 없는, 왕실 전용의 최고급 청자였다. 관요 도자기는 희소성이 극도로 높아,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수집가와 박물관이 가장 탐내는 도자기 중 하나다.
이 장경병은 단순히 아름다운 고미술품이 아니다.
그 안에는 송대의 미학, 왕실의 권위, 그리고 불완전 속에서 완전을 추구한 동양적 철학이 함께 담겨 있다. 균열 속에서 빛나는 문양은 세월이 쌓일수록 더욱 깊어지며, 인간의 삶 또한 시간과 흔적 속에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오늘날 이 병을 마주한 우리는 1,000년 전 북송 도공들의 숨결을 느끼게 된다. 어쩌면 그들이 전하려 한 말은 단순했을지도 모른다.
🌟
“아름다움은 흠결 속에서,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
(12kerre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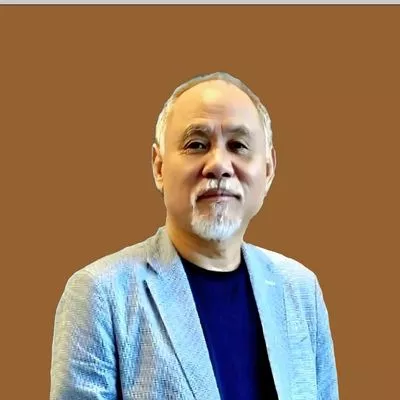
![[인물탐구] 조광규 대표, 경영과 예술을 잇는 다리](/_gallery/kced/202508/image-68a566e1dbd7c.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