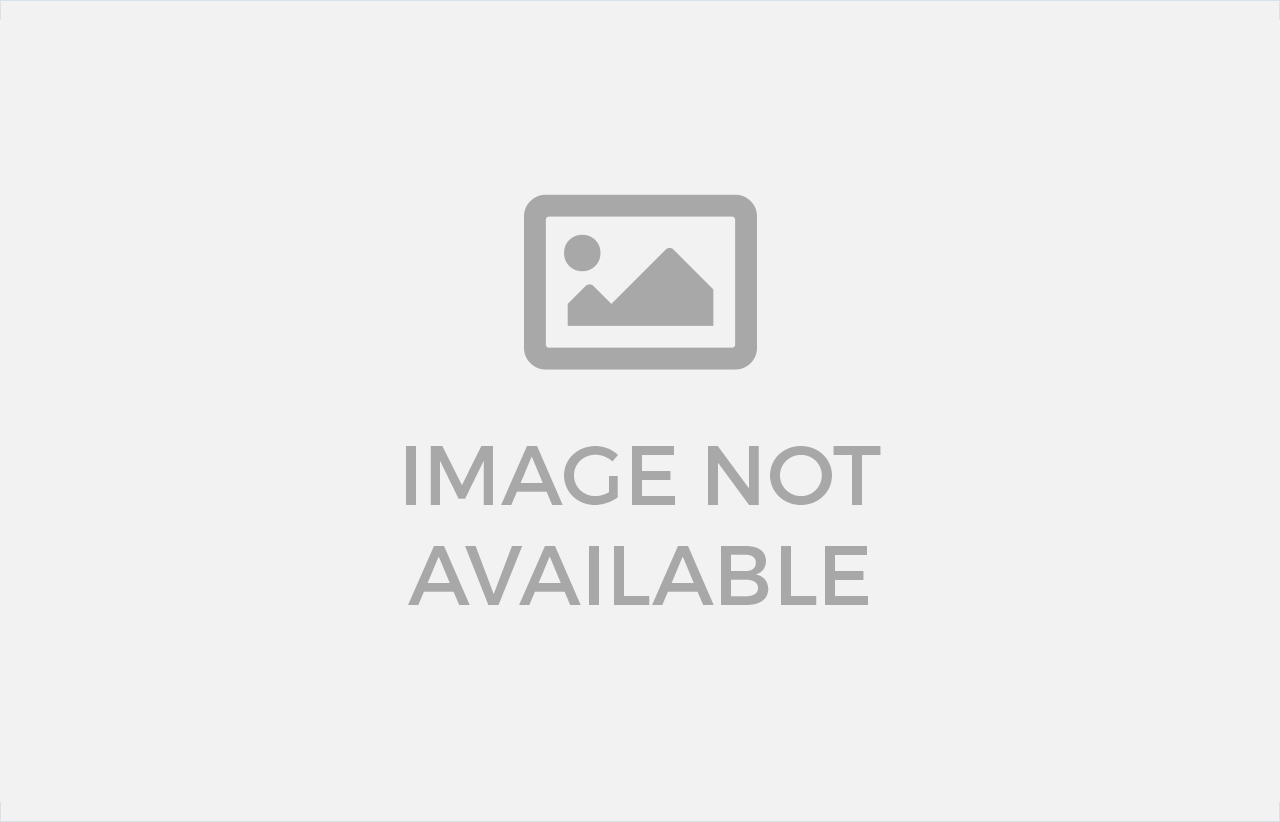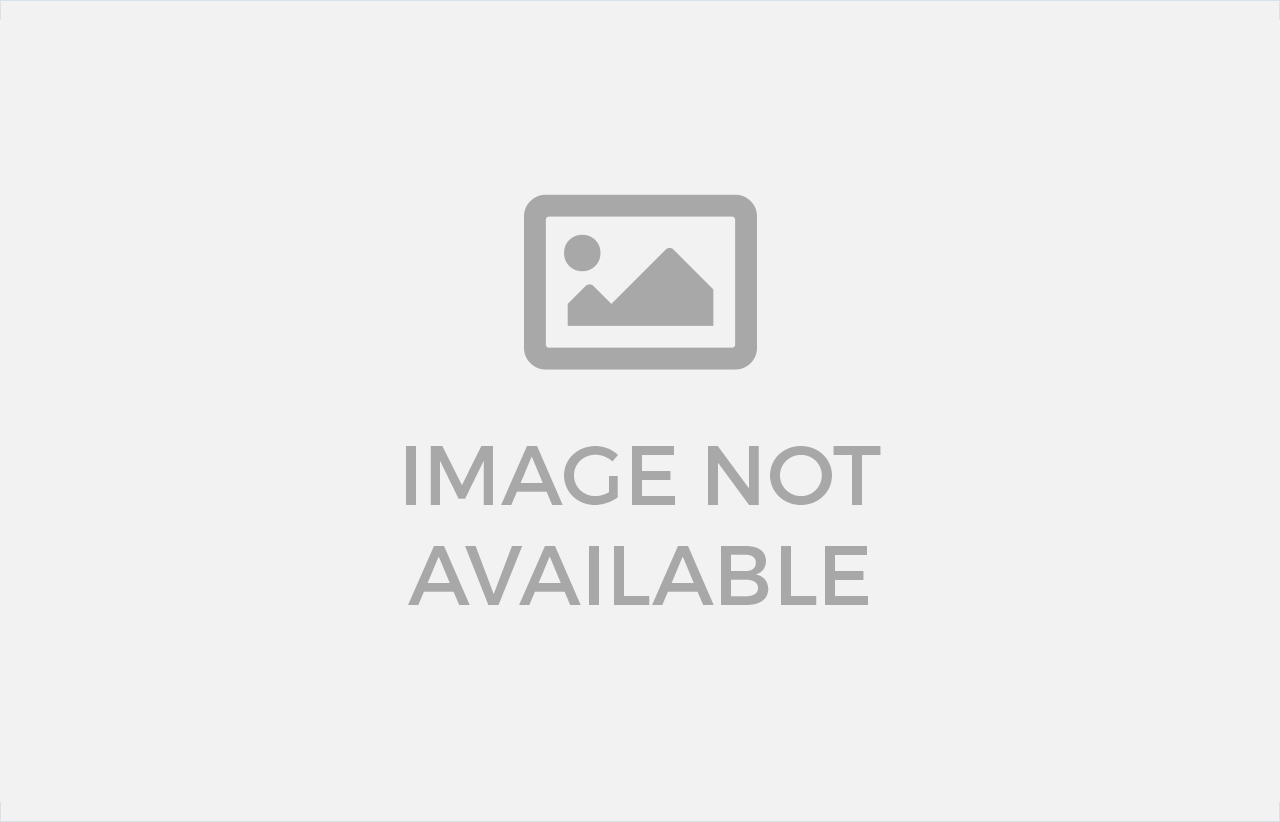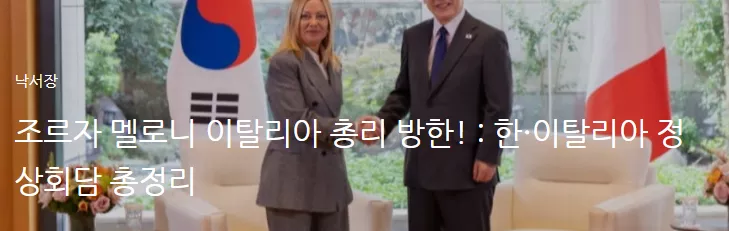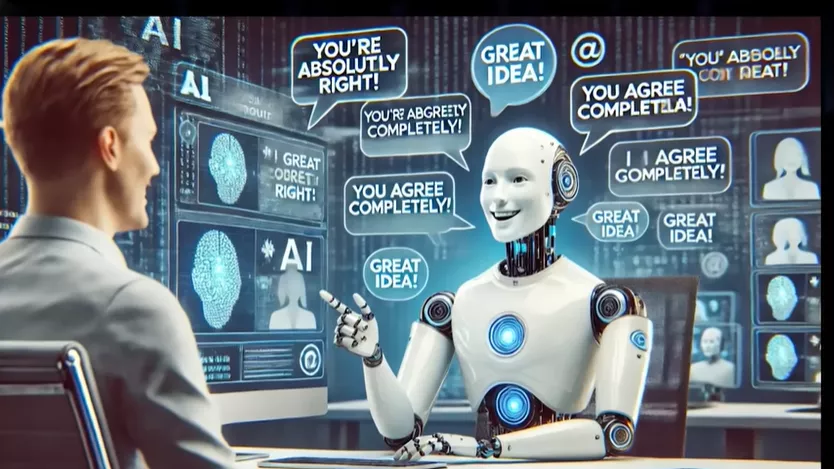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08-20 | 수정일 : 2025-08-20 | 조회수 : 1103 |

역사 속에서 예술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과 염원을 담은 또 하나의 ‘책’이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원대(1271~1368) 용천요 청자 옥호춘병(玉壺春瓶, 높이 18.6cm)은 그 증거다. 언뜻 작은 장식품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70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 원대 당시 도자기는 대체로 황실·관청의 주문, 혹은 해외 교역품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개별 장인의 이름보다는 가마(窯, kiln)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답니다.
이 병을 처음 바라보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몸체를 따라 흐르는 구불구불한 세로 능선(과릉, 瓜稜)이다. 마치 참외나 박을 세로로 쪼갠 듯한 골짜기가 규칙적으로 병의 곡면을 따라 올라간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장인들의 의도적인 성형 기법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당시 용천요의 도공들은 흙을 빚은 뒤 물레 위에서 손가락과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눌러 능선을 형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홈과 굴곡은 단순한 형태미를 넘어,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극적으로 연출한다. 특히 유약이 고르게 흘러내리지 않고 능선마다 머무르며 깊이 있는 색조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옥빛 청자가 단조롭지 않고 파도처럼 살아 있는 입체감을 얻게 된 것이다.
능선의 곡선은 또한 자연을 본받으려는 동양 미학의 산물이었다. 과일과 식물의 생장 곡선, 자연의 리듬을 병의 표면에 옮겨 놓음으로써, 장인들은 단순한 공예품을 자연의 일부로 승화시켰다. 곡선 하나하나에는 풍요와 다산, 그리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생명의 질서가 깃들어 있다.
‘옥호춘병(玉壺春瓶)’이라는 이름은 곧 ‘봄의 병’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계절적 상징을 넘어, 새로운 시작과 희망, 생명의 재생을 의미한다. 원대의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사람들은 예술 속에 희망을 담았고, 그 염원은 유약 속에 스며들어 오늘날까지 빛을 발하고 있다.
원대는 몽골 제국의 지배하에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용천요 청자는 중국을 넘어 서아시아와 유럽으로까지 수출되며, 국제적인 감각을 보여주었다. 즉, 이 작은 병은 단순히 중국 도자사의 일부가 아니라, 동서양 문화 교류의 산물이자 세계가 서로를 비추던 거울이었다.
이 옥호춘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고미술품이 아니라, 인류가 자연을 이해하고 삶을 노래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능선의 굴곡 속에는 장인의 손길이, 은은한 옥빛 유약 속에는 시대의 염원이 살아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병은 우리에게 말한다.
🌟“봄은 반드시 돌아오고, 생명은 이어지며, 문화는 나눌 때 더욱 빛난다.”

(12kerre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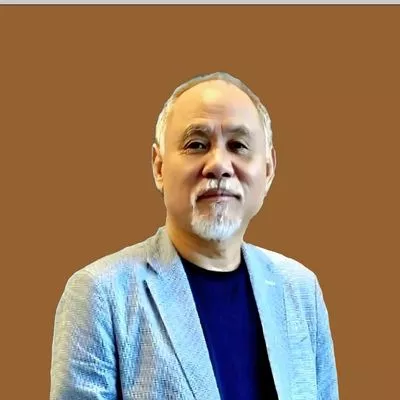
![[인물탐구] 조광규 대표, 경영과 예술을 잇는 다리](/_gallery/kced/202508/image-68a566e1dbd7c.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