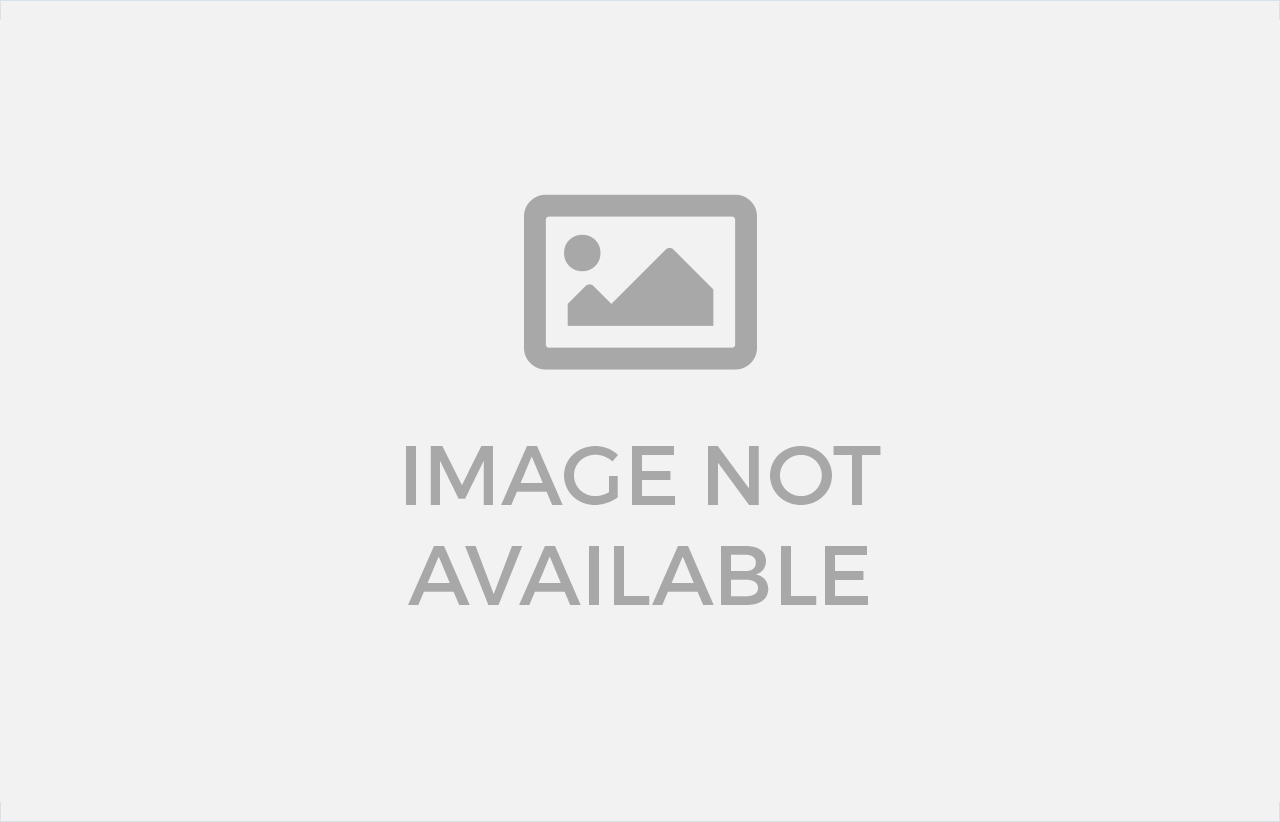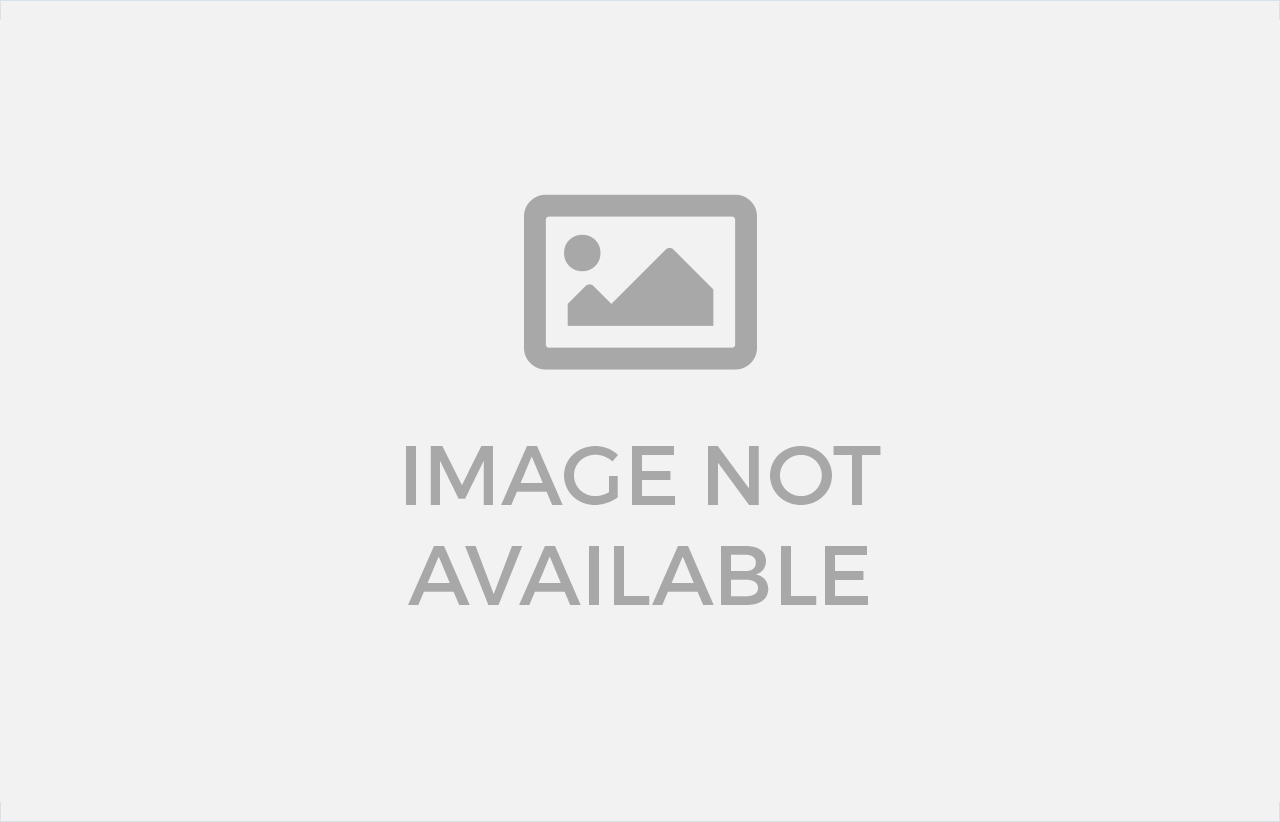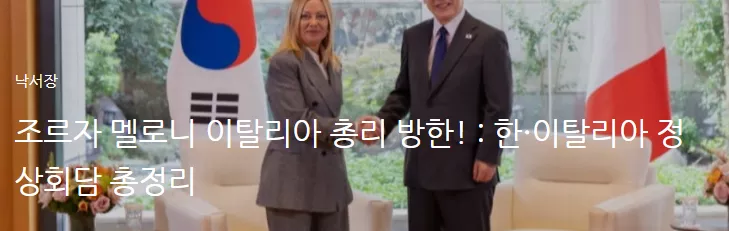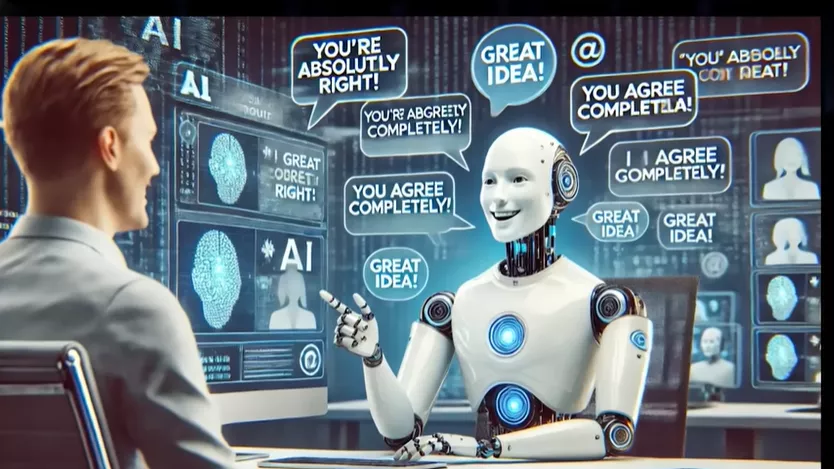| 최초 작성일 : 2025-08-26 | 수정일 : 2025-08-26 | 조회수 : 1011 |


천청유(天青釉)라 불리는 유약은 이름 그대로 하늘빛을 닮았다. 은은하게 흐르는 푸른빛은 결코 요란하지 않으며, 빛의 각도와 강도에 따라 다채로운 깊이를 드러낸다. 마치 비 갠 뒤 맑게 갠 하늘에 걸린 옅은 구름, 혹은 새벽녘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는 순간을 그대로 응고시킨 듯하다.
송대의 도공들은 색채의 절제를 통해 청자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유약 속에 은은히 스며든 빛의 결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정신적 상징이었다. 청색은 고결함과 순수함, 나아가 속세를 초월한 청정의 세계를 뜻했다. 그리하여 이 향로를 앞에 두고 앉으면, 마치 속세의 소란이 잦아들고 내면 깊은 곳의 고요가 살아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향로의 뚜껑을 장식한 봉황 문양은 섬세하면서도 힘차다. 봉황은 중국 고대에서 왕권과 성스러움,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로, 용과 함께 가장 고귀한 신조(神鳥)로 여겨졌다. 도공은 봉황이 구름 사이를 유영하듯 표현했으며, 투각 기법을 통해 무늬 사이로 빛과 향기가 자유롭게 흘러나가도록 설계했다.
연기가 피어오를 때, 봉황의 날개와 구름 사이로 은은히 흘러나오는 향은 단순한 의례를 넘어 신성한 공간을 창조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종교적·정신적 의미를 지닌 매개체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봉황 무늬와 연꽃받침의 조합은 곧 ‘천지인(天地人)의 조화’를 상징하며, 하늘과 땅, 인간의 세계를 하나의 기물 안에서 조화롭게 구현했다.
높이 20.5cm, 너비 16cm라는 수치만 놓고 보면 비교적 아담한 크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마주하면 그 이상으로 거대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받침 부분은 연꽃잎이 겹겹이 둘러싼 형태로, 대지의 생명력과 순환을 상징한다. 그 위로 올라서는 몸체와 뚜껑은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형상을 지니며, 봉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미지를 완성한다.
이 향로는 단순히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형태, 무늬, 비례, 유약의 색조가 완벽하게 조화되어, 보는 순간 누구나 숭엄함과 경건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송대 미학이 강조한 ‘자연과 조화되는 인공미’의 극치라 할 만하다.
1300~1400년 전 제작된 이 향로는 단순한 도자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전란과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약의 빛깔은 여전히 맑고 은은하다. 봉황 무늬의 조각선 또한 뚜렷하여, 그 당시 장인의 솜씨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증명한다.
이는 곧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예술의 힘이다. 흙과 불, 그리고 장인의 손끝에서 태어난 향로는 천 년을 넘어 오늘날 우리 앞에 선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예술혼이 응고된 영원한 기록이다.
전문가들은 이 향로를 단순한 유물이 아닌, 예술적·문화적 정수가 응축된 진품(眞品)으로 평가한다. 북송 시기의 천청유 향로 가운데 이렇게 완전한 형태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은 극히 드물다. 학술적 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미술사적, 문화사적 가치 또한 대단하다.
향로는 본디 향을 피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인간과 신성의 경계를 잇는 매개체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 담긴 숭엄한 정신, 그리고 시간의 강을 건너온 생명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북송의 천청유 봉황문 향로는 단순한 기물도, 단순한 장식품도 아니다. 그것은 예술과 철학, 권위와 신앙이 융합된 종합예술의 결정체이다. 하늘빛 유약은 청아한 이상세계를 상징하며, 봉황의 문양은 권위와 번영을 담고, 연꽃받침은 생명과 순환을 의미한다. 그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 하나의 숭엄한 조형미를 완성했다.
천 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우리 앞에 선 이 향로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예술적 영원성의 증거다. 그것은 도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미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12kerre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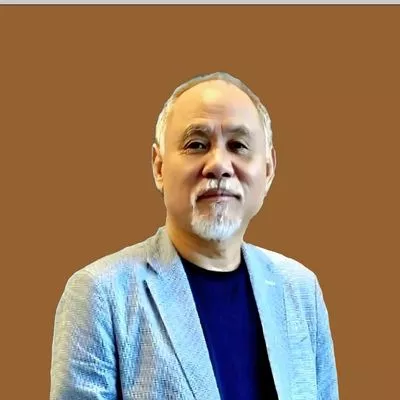
![[인물탐구] 조광규 대표, 경영과 예술을 잇는 다리](/_gallery/kced/202508/image-68a566e1dbd7c.png)